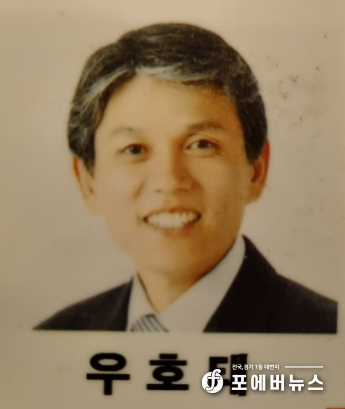
솔바람 소리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호새: 주변에도 소나무 숲이 많은데, 굳이 그 먼 울진까지 가야 하나요?
돈키: 거긴 금강송 군락지잖아. 제대로 된 소나무의 품격을 볼 수 있을 거야. 태백산에 같이 갔던 일행도 함께 간다네.
돈키: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이라… 이제 사람만 있으면 완벽하겠네.
농장맨: 태백산도 좋았는데, 이번 금강송단지 원행도 기대됩니다.
게스트: 이름부터 범상치 않네요. ‘금강송’이라니… 휘릭―
해설사: 국민 10명 중 6~7명은 소나무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가까이 있어 마음이 편안한 나무죠.
리틀맨: 그래서 그런가요, 굽은 소나무도 선산을 지킨다잖아요.
농장맨: 정이품송은 임금에게 절도 올렸다던데요.
해설사: 맞아요. 또 유배지에서 이상적에게 완당 선생이 건넨 <세한도>의 주인공도 소나무죠.
혹독한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으니, 참 우리 민족의 기상과 닮았습니다.
돈키: 근데 ‘금강송’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을까요?
해설사: 일본 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는 ‘적송’인데, 울진·봉화에서 금강산까지 이어진 소나무를 묶어 ‘금강송’이라 부른 거죠.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라서 참나무랑은 잘 안 어울려요.
그래도 이 일대가 워낙 오지라, 일제강점기에도 군락지가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답니다.
농장맨: 요즘엔 조경수로도 인기 많다던데요?
해설사: 네, 그렇습니다. 이곳 단지는 힐링센터, 치유공원으로도 활용돼요. 송화다식, 솔송편, 송이버섯 같은 먹거리도 있고요. 피톤치드 효능은 편백보다 낫다고 하네요. 게다가 목재 강도가 높아서 옛날엔 궁궐이나 배 건조용으로도 썼죠.
돈키: 금강송은 한대성 식물이라는데, 요즘 기후가 따뜻해지면 힘들지 않나요? 그럼, 해송은 좀 다를까요?
솔박사: 해송은 껍질이 검어서 ‘흑송’ 혹은 ‘곰솔’이라고 부르죠.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애국가의 그 ‘철갑’이 바로 소나무의 붉은 몸통을 뜻해요. 금강송은 곧게만 자란다고들 하지만, 햇볕 잘 드는 데선 굳이 하늘로 치솟을 필요가 없죠.
강도가 워낙 높아 조선시대엔 전함의 주재료로도 쓰였어요. 충무공의 학익진, 장사진… 그 화포의 충격을 견딘 게 바로 이 금강송이랍니다.
돈키: 가까이서 보면서도 몰랐네요. 참 대단한 나무네요.
솔박사: 지금 이 푸른 숲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지나 벌거숭이였던 산들이
반세기 만에 이렇게 푸르게 복원됐습니다.
예전 식목일이 지금의 ‘육림의 날’로 바뀐 것도 그 뜻을 잇기 위함이죠.
호새: 솔바람 소리가 피리나 거문고 소리보다 낫다던데요. 잠깐 귀 기울여 보세요.
돈키: 향도 참 좋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호새: 정신, 기상, 향, 재질, 가루, 껍질, 진액까지…
소나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어요.
돈키: 우듬지엔 새들도 잘 앉지 않더군.
어느 시인이 그러더라구요. 가던 길에 솔방울 하나 ‘툭’ 떨어지니, 오솔길이 환해졌다고….
호새: 금강송의 솔향이 바로 한민족의 품성 아닐까요? 요즘 사람은 코로나와 싸우고, 소나무는 재선충과 싸운다네요. “빨래는 얼면서도 마른다.”
어느 시인 말처럼요.
리틀맨: 입산통제라니 아쉽네요.
그럼, 죽변항이나 영진항 들러서 오징어라도 구경하죠?
게스트: 구경만 하자는 거야? 씹어보자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