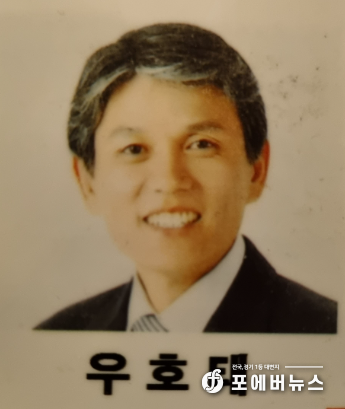
아리랑 고개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호새: 고갯길 오르니 산내음이 좋네요. 노래 한 곡조 뽑으시죠.
돈키: 좋지. 노래란 게 별거냐. 힘들어도 부르고, 슬퍼도 부르는 게 노래지. 산길에선 산노래가 제격이지.
(조용히 흥얼거리며)
“산에 산에 꽃이 피네, 들에 들에 꽃이 피네…”
호새: 그거 ‘산유화’잖아요?
돈키: 그래, 여러 이들이 작사하고 노래했지. 동산에 올라 휘파람 불며 부르면 참 좋아.
호새: 여긴 정선의 산고개잖아요. 뭐가 어울릴까요?
돈키: 글쎄, 뭘 부를까?
호새: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장터에서 곤드레밥도 먹었으니 ‘정선아리랑’이 딱이지요.
돈키: 아리랑! 좋지. 고개 오르기 전, 흥 좀 돋워볼까나.
호새: 그런데요, 밀양·진도 등 수많은 버전이 있다던데, 왜 그렇게 많을까요?
돈키: 부르는 사람과 시대마다 삶이 달랐으니 자연히 곡조와 말맛이 달라진 거지. 사랑과 애환, 노동과 정서가 배어 있는 게 아리랑이야. 그래서 세월을 건너도 통하지. 정선아리랑은 고려 때부터 전해왔다 하잖아. 작자 미상의 노래가 천년 세월을 버텼으니, 그게 바로 민족의 숨결이지.
호새: 부르면 좋고, 울면 위로되고, 춤추면 흥이 나는 노래네요.
돈키: 그렇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큰 노래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됐지. 후세에도 길이 이어질 거야.
호새: 산 좋고 물 좋으니 새 울고 꽃 피는 세상살이,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드는 게 순리지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사는 게 힘들다며 야단이에요. 나훈아 씨도 “테스형”을 부르며 묻더군요.
돈키: 그게 바로 세월의 무게지. 힘들면 아리랑을 부르는 거야. 만주, 사할린, 일본, LA, 중앙아시아, 독일, 아프리카까지—이민 간 동포들 가슴에도 울려 퍼졌어. 그만큼 아리랑엔 백성의 한과 사랑이 담겨 있지.
호새: 아리랑을 부르면 정말 힘이 나나 봐요?
돈키: 그래, 해외동포도 태극기 옆에 아리랑을 불러. 애국가 다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니, 그게 바로 마음의 약이지.
호새: 고개든 인생이든, 오르려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겠네요.
돈키: 맞아. 힘든 고개를 오를 때, 아리랑만큼 좋은 추임새가 없지. 요즘은 리듬도 경쾌해서 몸이 절로 움직여. 제대로 배워두면 참 좋을 거야.
호새: 후렴에 모두 어울려 춤추는 모습, 생각만 해도 흥이 납니다.
돈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신바람이 나지. 아픔이 녹고 마음이 추스러지는 노래야. 가사도 제멋대로 바꾸어 부르니 바람결에 버들가지 같아.
호새: 강원도 왔으니 정선식으로 한 소절 들어봐요.
돈키: 좋아, 내가 1절, 자네가 2절, 후렴은 함께 가세.
(돈키)
“열라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열리나”
(함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자~”
(호새)
“하라는 일들은 왜 아니 하고
우리네 애간장을 왜 태우나”
(함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산고개와 인생고개를 함께 넘는 노래가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넘어 흐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