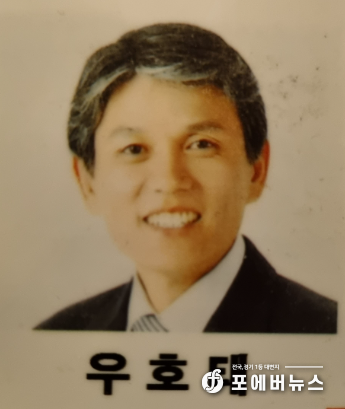
기(氣)를 기(器)로 나타내다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돈키: 기(氣)를 기(技)로 담아낸 그릇이 도자기지. 비취빛 청자, 도예가 심수관, 도자비엔날레… 도자 전통의 맥을 잇는 고을에 가보자꾸나.
호새: 그런데 도기와 자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돈키: 산화소성으로 굽는 게 도기, 환원소성으로 발색을 유도해 구운 게 자기야. 그 환원소성 덕분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청자와 백자가 태어난 것이지.
호새: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돈키: 그렇지. 광주는 왕실 도자기를 주로 만들었고, 여주와 이천은 생활 도자기를 많이 생산했어. 지금도 이 전통을 살려 도자기 비엔날레가 열려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
호새: 원래는 토기에서 비롯된 그릇 아닌가요?
돈키: 맞다. 고분에서 발굴되는 토기가 그 증거지. 정착생활에는 식량 저장용기가 필요했으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햇볕에 말리던 단계에서, 흙에 안료를 섞고 유약을 발라 가마에서 구워내는 경지에 이른 거야. 특히 고려의 상감청자는 기법이 독특해 지금도 국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지. 송나라 사신 서긍도 『고려도경』에서 찬탄했지. 조선시대엔 청화백자가 이름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의 후예가 바로 심수관 같은 장인이야.
호새: 결국 도자기도 그릇인데, 왜 그토록 귀하게 여겼을까요?
돈키: 본래는 생활필수품이지만, 그릇에도 자연과 정신을 담았으니 예술품이 되는 거지. 거실이나 서재에 놓이면 집안의 품격을 돋우잖아. 흔한 플라스틱과는 다르지.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나 ‘대기만성(大器晩成)’ 같은 말도 결국 그릇에 깃든 정신을 빗댄 거야.
호새: 여주·이천·광주는 쌀도 유명하다지요?
돈키: 그렇다. 남한강 물줄기가 수려해 수라상에 오를 만큼 쌀맛도 뛰어나지. 고찰과 역사의 흔적도 많고, 세상을 뒤흔든 인물들도 배출되었어.
호새: 질그릇은 생활용기였지요?
돈키: 흙으로 빚어 구운 거라 우리 삶을 닮았어. 투박하지만 쓰임새가 크지. 어린 시절 돌팔매로 장독을 깨뜨리고 혼나던 기억도 있네. 깨지기 쉽다 해서 성경에서도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지. 결국 토기든 도자기든 본질은 ‘쓰임’이야. 강아지 밥그릇이든 예술품이든, 쓰는 이의 몫이지.
호새: 연적, 주전자, 술병, 항아리, 탁자… 참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곁에 있군요.
돈키: 그렇지. 대청마루나 서재에 놓인 도자기는 집안의 분위기를 돋우지. 도공의 장인정신이 깃든 예술품, 곧 자기 삶의 그릇이라 해야겠지.
호새: 그렇다면 제 그릇은 뭐가 될까요?
돈키: 글쎄, 네 속을 어찌 알겠냐. 용마도 있고 비마도 있겠지만, 그냥 내겐 돈키호태의 애마가 제일 좋다네.
호새: 값비싼 골동품은 얼마나 할까요?
돈키: 값도 값이려니와, 그 안의 혼과 예술성에 대한 평가가 더 크지. 천년을 건너온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국제경매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바로 그 때문이야.
호새: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값은 얼마나일까요?
돈키: 하하… 글쎄다. 말값보다는 낫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