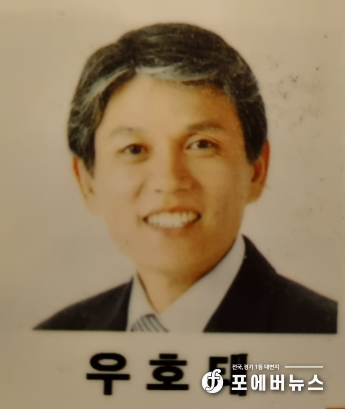
울렁울렁 처녀가슴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호새: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바다를 건너요.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를 추고,
울릉도는 정말 아름답네요.
아가씨들 고운 얼굴, 달달한 호박엿 냄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말, 괜히 나왔겠어요?
오징어 풍년이면 시집간다던 그 노래처럼,
트위스트 한 곡 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돈키:
바닷바람 참 시원하다.
울릉도 트위스트, 뱃전에 나부끼면 더 신나겠는걸.
호새:
울릉도 아가씨한테 눈 팔 생각 말고,
저기 뱃머리에 서봐요.
오늘은 ‘돈키호태와 호새’가 아니라 ‘잭과 로즈’ 같잖아요.
눈 감고, 제 등에 올라서 봐요. 어때요?
돈키:
와– 바다가 끝이 없네!
호새:
이거 뭐예요, 장단은 맞춰야죠.
돈키:
쏘리 쏘리~ 그냥 해본 말이야.
울릉도 마라톤대회 다녀오고 오랜만에 다시 온 거라서 그래.
호새:
혼자 뛴 거예요?
돈키:
아니, ‘마라톤 삼총사’ 동창들이랑 같이 뛰었지.
호새:
그래도 뭔가 사연 있어 보이네요?
돈키:
있지. 왼쪽 눈 찡긋하면,
항구에 사는 아주머니가 달덩이처럼 웃으며
살이 통통한 놈으로 회를 썰어주시거든.
그 맛이란,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정도야.
게다가 울릉살이 덤으로 따라오지.
바다바람 맞은 부지갱이 나물밥 맛도 일품이고,
그 맛에 또 오는 거야.
호새: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정벌한 ‘우산국’이
바로 이 울릉도라죠?
돈키:
그래. 고려 때는 여진 해적도 침입했다더군.
그래서 이 섬이 동해 해양사를 밝히는 단초가 돼.
우린 늘 내륙 위주로만 역사를 배웠잖아.
하지만 한반도는 예로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온 땅이야.
옥저, 동예, 고구려, 신라, 발해, 고려…
동해의 역사는 대륙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하지.
호새:
그렇다면, 독도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돈키:
그럼.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정광태의 노래가 괜히 국민가가 된 게 아니야.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 바다를 지키려는 의지였거든.
호새: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 말해야 하는 현실,
참 서글프네요.
돈키:
그래도 알아야 해.
북쪽엔 중·러, 동해엔 일본, 서해엔 중국, 남해엔 또 일본이 있지.
쇄국정책의 후유증이 오래 남은 셈이야.
스스로 우물 안에 갇혀 살면 세상은 멀어지지.
근원을 아는 게 곧 나를 밝히는 길이야.
호새:
역사를 보면, 바다를 향해 나아간 인물들이 참 많죠.
돈키:
그렇지.
동쪽엔 지증왕, 어부 안용복, 이승만 대통령,
서쪽엔 근초고왕,
남해엔 장보고, 태종, 세종대왕,
북쪽엔 고주몽, 광개토대왕…
그리고 대마도의 최익현 지사, 헤이그의 이준 열사,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홍구공원의 윤봉길 의사,
샌프란시스코의 장인환·전명운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바다를 지키고 나라의 혼을 밝혔지.
호새:
앞으로도 나라 사이의 바다 갈등은 계속될까요?
돈키:
경제가 서로 얽혀 국경이 희미해졌다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지.
우린 삼면이 바다인 나라야.
그 바다의 목줄, 바로 독도를 잊으면 안 돼.
호새:
그렇다고 저더러 바닷물 한 모금 마시란 건 아니죠?
돈키:
하하, “두만강수음마무(豆滿江水飮馬無)”라는 말이 있잖아.
동해 물 한 모금 마시면 큰 바다로 날아갈지도 몰라.
호새:
그럼, 호박엿이나 하나 살까요?
돈키:
왜, 엿이나 먹으라고?
(둘이 환히 허리 젖혀 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