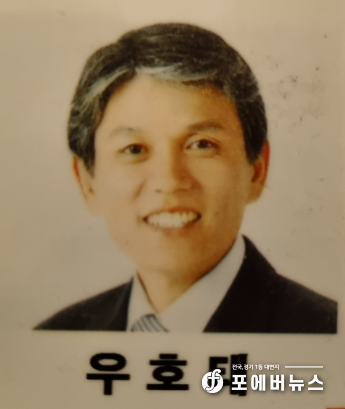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돈키: 수백 년의 세월을 단 하루 만에 훑는 게 쉽지 않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려니 정신이 바쁘다. 공주나 부여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은 머물러야 백제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성박사: 그렇지. 세상을 놀라게 한 송산리 고분군의 무령왕릉, 그리고 금강을 굽어보는 공산성, 더불어 공주국립박물관과 부여박물관은 백제문화의 보물창고야.
온조왕을 비롯해 웅진시대 왕들을 모신 숭덕전, 제민천이 흐르는 시내거리, 공주감영터, 새로 들어서는 한옥과 오래된 교회·성지까지-도시 자체가 역사를 품은 무늬 하나야. 눈여겨보면 백제의 생활결이 자연스레 스며들지.
김기자: 좋은 역사공부가 되겠어요.
돈키: 삼한 중에서도 마한연맹체가 백제로 이어졌고, 결국 나·당 연합군에게 패망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생활양식·유물·유적으로 살피면 더 흥미로워.
내 고향에도 백제시대 산성과 고분이 곳곳에 있어. 그런 점에서 이 여정은 내겐 정신적 귀향이야. 학문적 해석은 학자들의 몫이지만, 그 맥락을 느끼는 건 우리의 몫이지.
성박사: 그래서 “검이불누,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이 말이 백제문화를 상징하지. 무령왕릉이 바로 그 대표적 예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4,600여 점의 유물이 공주의 생활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무덤 속의 지석(誌石)은 백제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세력 분포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야. 결국 강줄기 따라 사람이 살고, 역사가 흘러온다는 걸 증명하지.
돈키: 백제 중심으로 본다면 이야기의 축은 많지.
한성의 위례성, 금강유역의 석장리·나성리, 그리고 공산성·부소산성-이들이 모두 백제의 숨결을 잇는 증거지.
김기자: 무덤이 정말 ‘역사적 타임캡슐’이네요.
돈키: 맞아. 무령왕릉이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백제를 둘러싼 고구려·신라·왜·남북조의 교류사가 다시 읽히게 되었어. 역사는 대개 승자의 기록이라 왜곡되기 쉬운데, 무덤의 실체는 종종 그런 왜곡을 바로잡는 열쇠가 되지. 흩어져 있던 설들을 한데 잇는 진짜 사료라 할 수 있어.
성박사: 맞아. 무령왕릉 발굴로 밝혀진 바, 백제는 남조의 양나라 및 일본 열도와 활발히 교역했어. 당시 이미 해양교류의 중심이었던 셈이지. 백제를 단순히 한반도 왕국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문화권을 잇던 해양대국으로도 볼 수 있지.
돈키: 그렇지.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또 사비로 천도했잖아. 공주·부여·익산은 육상벨트, 금강의 물길은 수상벨트로 이어졌지.
만약 백제가 멸망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보다
나는 백제의 개방성을 주목하고 싶어. 웅진시대의 계획도시 ‘나성리’를 보면 지금의 세종시와 맞닿은 듯해. 고대 왕국이 꿈꾸던 영화가 오늘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셈이지. 사람이 아픔 속에서 성장하듯, 지역도 그렇거든.
김기자: 백제는 ‘검이불루 화이불치’의 미학을 남겼고,
무령왕은 금동신발을 남겼네요.
호새: 주인님은 뭘 남기실 거예요?
돈키: 글쎄, 남길 게 뭐 있겠어. 그냥 쭈욱 걷는 발길이면 족하지. 고(故) 최희준 선생 노래처럼,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옛날엔 초상이 나면 망자의 신발을 대문 밖에 두었어. 어릴 적 신발 던지기 놀이도 있었고. 작가 중엔 ‘아홉 켤레의 구두’를 쓴 사람도 있더군. 살아있는 자나 떠난 자나, 신발은 발길의 의미를 품고 있지. 그게 왕의 신발이라면, 그 발길의 무게가 얼마나 다를까?
김기자: 그래서 어떤 발길을 남기시려구요?
돈키: 하하, 글쎄. 내 취미가 마라톤이니 ‘‘금강–백마강 강변마라톤’이라도 뛰어볼까. 공주에서 부여로, 백제왕도 길따라 달려 보는거야.
호새: 그럼 나도 뛰어요! 내 이름이 ‘백마(白馬)’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