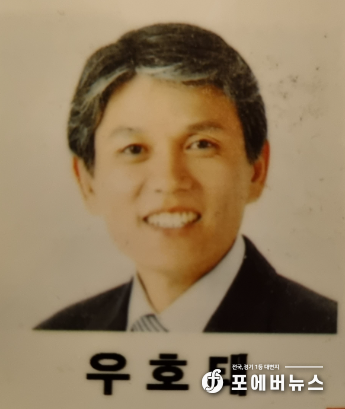
격몽요결(擊蒙要訣)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돈키: 사각사각, 가을 오는 소리가 들리네. 오늘은 율곡 선생이 제자들과 노닐던 화석정(花石亭)을 들러볼까 한다네.
호새: 아, 오천원권 지폐 속에 정자관 쓰신 그 선비 아저씨 말이지요?
돈키: 그래. 그분의 발자취가 크고 깊으니 살펴볼 만하지 않겠나. 화폐에 새겨진 이들은 저마다 불굴의 기상과 큰 뜻을 남긴 분들이야. 세종대왕, 신사임당, 퇴계, 율곡, 충무공 모두 그러하지.
호새: 그냥 멀리서 마음에만 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돈키: 어허, 뜻이 일면 몸도 움직여야 일이 빛나지. 가보자꾸나. — 휘릭
호새: 저기 화석정 현판이 보이네요. 전망이 확 트여 강과 산이 어우러진, 노을 질 무렵은 참으로 장관이겠어요.
돈키: 오길 잘했지 않나? 저 강물처럼 율곡 선생의 사상과 정신도 세월을 흘러 길이 이어지리라.
호새: 그런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성리학을 자꾸 되새길 까닭이 있나요?
돈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성리학이 낡아 보일 수도 있지. 그러나 조선 오백 년을 이끈 통치 이념이었네. 지도자의 품성과 자세에 따라 나라의 품격이 달라지는 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례가 이를 증명하지.
호새: 그 성리학이란 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없나요?
돈키: 공자와 맹자의 유학을 성리(性理)와 이기(理氣)라는 형이상학 체계로 정리한 공부라 할 수 있지. 만물은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졌는데, 이가 주재한다는 주리론, 기가 실제 움직이며 존재를 이룬다는 주기론이 있었네.
퇴계 이황은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相不雜)’ 하여 이기이원론을, 율곡 선생은 ‘이와 기는 떨어질 수 없다(相不離)’ 하여 이기일원론을 주장했네. 훗날 실학으로도 이어진 큰 줄기라네.
호새: 대학 입시 준비하듯 머리 아프겠군요.
돈키: 나도 수능 땐 찍었는데,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이제야 조금 알게 되더군.
호새: 성리학자요 정치사상가니 곧은 말씀도 많이 하셨겠지요?
돈키: 그렇지. 정치개혁 보고서라 할 만한 <동호문답>, 선조 임금께 올린 <만언봉사>, 왕의 학문 지침서 <성학집요>… 후학들을 위해 쓴 <격몽요결>도 빼놓을 수 없네. 그 요지는 세 가지야. 변화할 때는 변화하고(變通), 고칠 것은 고치고(更張),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安民). 율곡은 목숨 걸고 간언했네.
호새: 임금이 그 처방을 따랐나요?
돈키: 당시 조정은 패거리가 판을 치고, 사대부들은 공자왈 맹자왈 하며 집안 곳간만 채웠지. 그러니 나라가 기울 수밖에.
호새: 퇴계의 <성학십도>나 율곡의 <성학집요>가 있었는데도 귀를 막아버린 거군요.
돈키: 그렇네. ‘성학(聖學)’이란 글자를 풀면 입(口)과 귀(耳), 그리고 임금(壬)이 들어 있어. 곧 백성의 말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게 성학이지. 퇴계의 ‘경(敬)’을 소홀히 하고, 율곡의 ‘십만양병설’을 외면하다가 결국 국토가 유린당했네. 임금은 임진강을 넘어 의주까지 피난했고, 백성들은 목숨을 잃어 이총(耳塚)이라는 아픈 흔적을 남겼지.
호새: 듣다 보니 요즘도 “그딴 거 더 부셔, 돈 되는 건 더 챙겨, 무조건 더 우겨”는 소리가 들려오던데, 조선시대의 ‘공자.맹자 왈이나, 당파로 싸움질이나'의 ‘이나’가 지금은 ‘여’로 바뀐 건가요?
돈키: 평가야 언제든 할 수 있지. 다만 중요한 건, 율곡이 말한 기본 정신이야.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이 바탕이 되어야 사람도, 나라도 품격을 지니는 거다.
호새: 참 공부란 그런 거군요. 하지만 원로들이 상소를 내고, 요즘 젊은 이들이 신발 던져 시무상소를 올려도 귀 막은 사람들 앞에선 무슨 소용일까요?
돈키: 구한말에서 오늘까지, 우리는 이념과 종교, 지역과 세대의 갈등 속에 뒤엉켜 왔지. 그러나 한(恨)도 풀고, 배도 채웠으니 이제는 새로운 아침을 맞아야 하지 않겠나.
호새: 성자의 뜻을 깨우친 이들이 씨름판에 오르고, 인덕을 갖춘 천하장사가 태어나기를 두 손 모아 빌어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