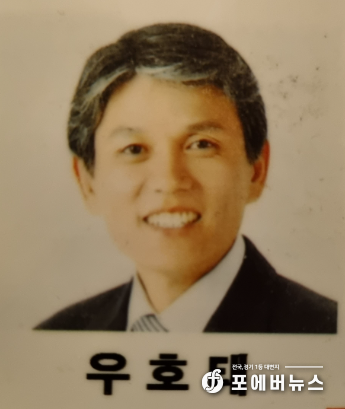
황구지천변 기행15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팔월 첫 휴일이 슬며시 문을 연다. 달궈진 공기 속에 온몸이 늘어지듯 숨을 돌린다. 사방에서 날아든 동창들의 피서 장면들 — 키르키스탄의 드높은 초원길, 발트 3국 바닷가, 수박화채 한 사발, 벼랑 끝 위태한 AI 이미지 — 그 하나하나가 상상만으로도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하다.
죽장을 손에 쥐고 모자를 눌러쓴 채 천변 뚝방길에 올랐다. 러닝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내달리는 사람들 사이를 슬며시 걷는다. 다산 정약용의 ‘소서팔사(小暑 八事)’가 떠오른다. 어찌하여 옛날의 천렵과 복다림은 전래 피서법으로 남았으면서, 이열치열 달리기와 트래킹은 순위에 들지 못했을까. 오늘날 최고의 피서는 방 안 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삼복 더위에도 길 위를 걷는 데 익숙해진 터라 마음은 느긋하다. 들판의 벼포기들이 어느새 한 뼘 더 자랐고, 덩굴손은 여린 나무를 휘감으며 허공으로 뻗어 오른다.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기운이 나날이 푸르다. 청춘이란 저런 것이리라.
걸음을 멈추고 풀꽃에게 눈길을 준다. 폰에 담긴 이름 모를 생명들을 검색해보니 하늘타리, 쇠무릎, 쉬땅나무, 새팥, 서양민들레… 처음 부치는 이름들이 낯설고도 반갑다. 특히 쉬땅나무 꽃은 흰 보풀 같아서 세상사에 피로한 눈길에 잔잔한 약효를 건넨다.
지나는 이들과 “그저 열심히 삽니다” 인사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 어느새 집 앞 들판이다. 꽃과 풀 사이를 누비던 한 마리 호랑나비가 불쑥 나타난다. “내 여기 있다” 외치듯 날갯짓을 한다. 불러주는 이 없어도, 제 때 꽃 피우고 날갯짓하며 사는 것이 삶이라 일깨우는 듯하다. 현자들이 말하던 ‘자기 삶에 충실하라’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다.
후덥지근한 기운 속에 한바탕 소나기가 올 듯하다.
그저 속으로 읊조린다.
> “호랑나비야, 날아라 —
하늘 높이, 더 높이 날아라.”
